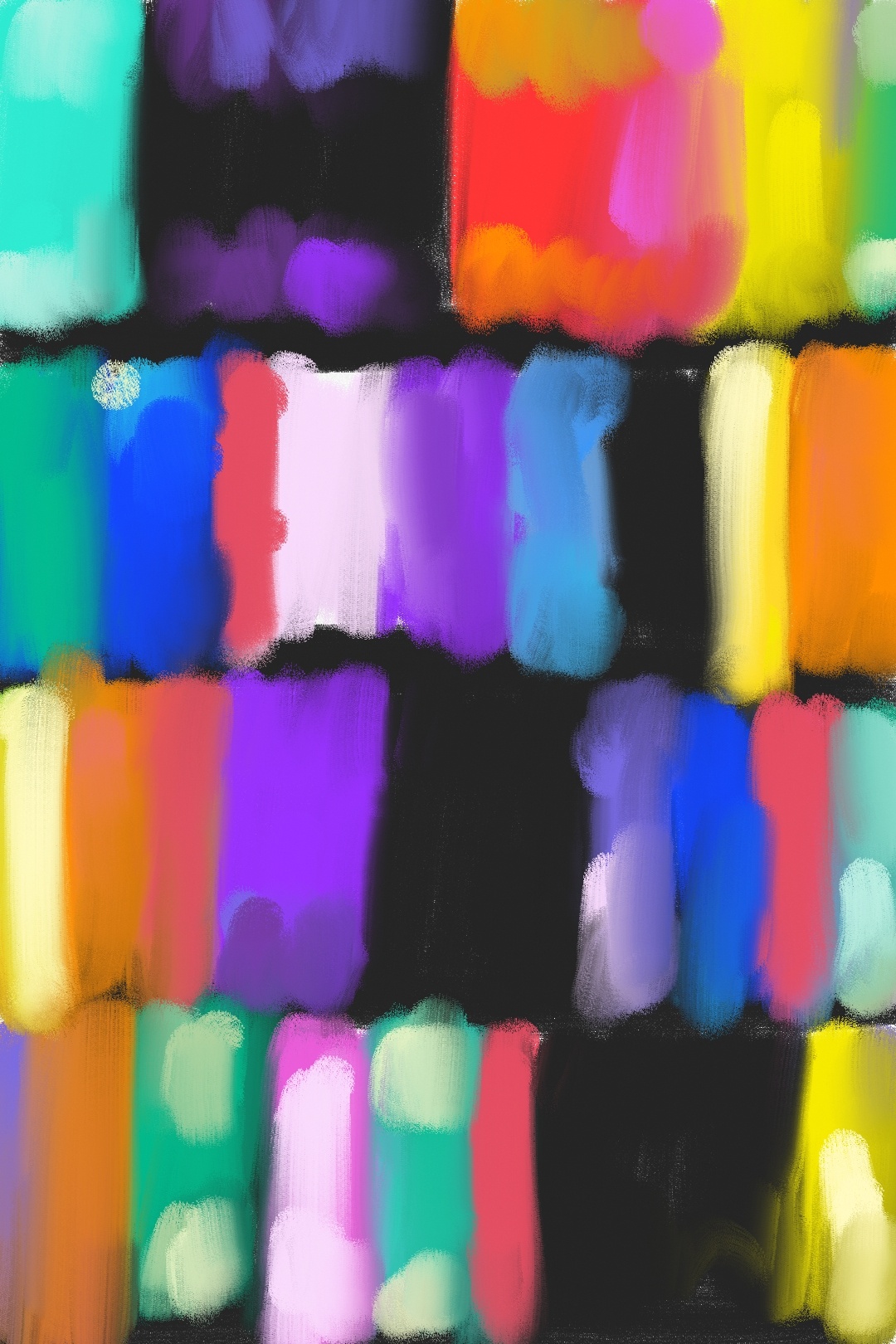한 사람을 온전히 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감히 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안다는 것도,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뭔가 부족하고 미흡해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사람을 다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저의 추도사 역시 부정확할 겁니다. 다분히 주관적이고 온정주의에 입각한 것일 테니 말이지요.
그럼에도 고인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고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곱다는 건 심성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실크의 감촉이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이분만큼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길 좋아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했을 뿐인데도 종종 놀라운 일이 벌어지곤 했지요. 그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보다 명랑해지고 대담해졌고 지혜로워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보면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단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졌지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같이 고민해주었습니다. 이윽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면 축복해주었고 그걸 보면서 자신의 일인 양 뿌듯해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같습니다. 길을 가든, 공원을 산책하든 자주 멈췄고, 작은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수고로움을 견뎌야 했지만, 그는 작고 사소한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을 때조차 평정심을 가지고 대하려 노력했고, 연금술사처럼 고난을 삶의 예술로 만드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는 아마추어리즘을 신봉했지만(실제로 아마추어였습니다), 그가 쓴 글과 찍은 사진은 소박하지만 영롱했습니다. 글은 언제나 따뜻한 활기가 넘쳤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재능과 미덕을 발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진 역시 소박하고 정갈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명상인류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명상 수련과 영적 훈련을 통해 자기중심에서 우리, 우리 중심으로 의식이 옮겨 가기를 바랐으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두워진 유리창’의 눈으로 살아가는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분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언제까지나 살아 있을 거라는 걸 말이지요. 그가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의도와 사명, 선물까지도요.
#김기섭의수행이필요해
#미리쓰는추도사
#명상인류
#참새방앗간
'수행이 필요해-명상인류를 위하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는 여전히 ‘셋째딸’이고 싶다 (2) | 2022.09.23 |
|---|---|
|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지는 법 (0) | 2022.09.15 |
| ‘괜찮아 아저씨’가 주는 선물 (0) | 2022.08.26 |
| 곰돌이 푸가 전하는 ‘오늘 사용법’ (0) | 2022.08.18 |
| ⁸가끔은 색다른 음식을 먹어 보자 (0) | 2022.08.11 |